글쓴이 : SOONDORI
스멀스멀 몸안을 기어 다니는 이를 죽이자고 뿌렸다는 밀가루 성상의 하얀색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1945년, 미국 농무부가 살충제로 허가. 원천 물질의 보완자인 스위스 폴 밀러가 1948년에 노벨상까지 탔다고 하고… 그러다가 사람과 동물을 서서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것이 확인되면서 1972년에 사용 금지. (The New Yorker 잡지의 William Shawn이 1962년에 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 촉발했던 DDT 사용 반대 기조가 조금 더 늦게 시작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튼 미국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타국에서는 한참을 더 뿌려댔던 모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기가 1979년이라고 하는데 설마? 곧바로 중단했을리가 없으며…
미국 시장에서 큰 이익을 보던 자들이 “DDT is good for me~♬” 찬가를 부르고 다녔다는 게 심히 경악스럽고 재수가 없다.

(▲ 1947년의 미국 광고. 출처 :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DDT-is-good-for-me-An-advertisement-for-widespread-farm-home-and-food-processing-use_fig1_263740149)
다음은 농업용 살충제로서의 DDT의 물성과 사용법이 적혀 있는 미 해군 발행 문서 중 일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오일 성분의 땀이 나게 마련이고 군인이면 더 그러하니까… 완전히 말장난이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가루가 피부에 묻어도 성분이 흡수되지 않는다. 다만, 유성인 상태 그리고 다량이 사용될 경우는 과민반응과…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there is no absorption of the dry power from the skin, but concentrated oily solutions are absorbed, large doses causing hyperexcitability… repeated or prolonged contact must be avoided…”


(출처 : https://collections.nlm.nih.gov/ext/dw/29620530R/PDF/29620530R.pdf)
DDT는 쉽게 분해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 6.25 동란 이후 1980년대까지 아무 생각 없이 뿌린 DDT가 21세기 우리나라의 그 동네에, 그 들판에, 그 지하수에 잔존하고 있을 것.
“판매 금지 DDT, 어떻게 친환경 달걀에서 발견됐을까?…농식품부,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두곳에서 검출 확인. 한살림 “토양에 잔류한 DDT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 당국 “토양 검출 확인되면 검사에 DDT 추가 검토”…((한겨레, 2017.08.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7660.html)”
가만 보면,
전기로 전등을 켜고 오디오를 듣고 TV를 보다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된 인류는 생각보다 무식하다. 돈벌이 때문인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었던 사람 수’ > ‘DDT로 피해를 입은 사람 수’를 충족하면 모든 게 합당하고, 전혀 무식하지 않은 것인지?
“나 죽으면 너도 죽지롱~” 이제는 DDT 내성이 생겼다는 빈대와 이, 말라리아모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표제부 사진 출처 : https://53857731.weebly.com/what-is-ddt.html)
○ (내용 추가) 아래 김*근 님과의 대화에 착안하여… 믿거나 말거나 그 시절의 연막차, 방구차에서 DDT를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다. 다른 경제적인 대안이 있었을까? 당연히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함.
“…또한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나 파리 등 해충을 없애기 위한 방역활동도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1970년대 이전에는 유행성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은 금지된 DDT를 살포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해성이 적은 소독제를 정해 법정소독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disinfect.do)”

(출처 및 추가 사진 열람 : 서울사진아카이브, http://115.84.165.213/photo/view/129634?keyword=%EB%B0%A9%EC%97%AD&page=1#1_83252)
○ 유럽지역 DDT 사용.

(▲ 1930년대 프랑스 광고. 출처 : https://digital.sciencehistory.org/works/p8418n399)

(출처 : https://53857731.weebly.com/what-is-dd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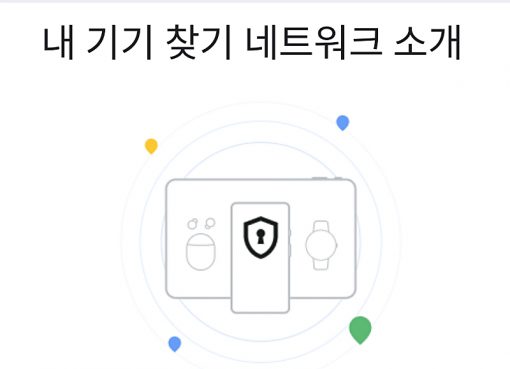
마지막 사진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전에? 지금도 그럴수 있지만, 머리에 이가 정말 많았죠.
저도 소실적에는 참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이가 떨어지는 ㅡㅡ
지금 생각해보면 ,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마을 공동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정말 귀했습니다.
따뜻한물은 노력의 댓가?(산에서 나무를 구해서 가마숱에 물을 데워 쓰던 시절)이라서
겨울만 되면 뒷동산에 나무구하러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것 보면 현재는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더 느끼게 합니다.
그 덕분에 이도 많이 사라졌지요.
저 살충제로 이 뿐만 아니라 해충? 모두 사라지니 정말 대단한 발견이라 치켜세웠는데,
현실은 그 부작용으로 몇배의 고충에 시달려야 하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기술과 발명은 10년 뒤에 독이될지 득이될지 아무도 모르는것이죠.
○ 저 DDT는… 옛날 방구차, 연막차에서도 썼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늦은 시점까지 사용했고 그러면 등유에 살충제 섞어 태워 뿌리는 그 작업에서 DDT를 안 쓸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김정근 님도 또 다른 분들도… 열심히 다 따라다녔잖습니까? 저희는 오염자일 가능성이… 누구도 단위 보건소, 지자체에서 신나게 DDT를 썼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깡촌에, 더 깡촌이었다면 방구차를 보지 못했을 것이죠?
○ 그렇네요. 지게 지고 ‘낭구하러 가서’ 땔감을 많이 구해와야 물 끓이고… 잔가지로 밥을 지어먹던 시절이 있었네요. 호롱불 기름 사러 고개를 넘고 간신히 라디오가 하나 있던 시절… 떨어진 똥뚜칸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는지는 생각도 못할, 뱃속 회충은 기본이었던 시절. 질질 콧물도 기본이고… 채변 봉투 걷던 시절 내지 그 이전의 시절… 계란 하나 먹었다고 며칠을 놀림받았던 때가 생각나며… 훗날 생각하니 놀림받을만 했죠.
아련합니다.